정신과 첫 방문 후기
1일차 - 첫 병원내원
"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
드디어 미루고 미루다 정신과를 방문했다.
미룬다면 더 미룰 수 있었겠지만,
지난 3개월 간 나의 감정 상태는 아래 사진과 같았다.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검은 물 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또 끝없이 가라앉는 기분...
글로는 더 표현할 수 없는, 저 기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것이다.
그 3개월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이곳에
우울 일지를 써가면서 자세히 써 보기로 한다.
" 그래 니가 이겼다. "
이렇게 계속 가라앉기만 하다가는
영영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큰맘 먹고 집에서 두번째로 가까운 정신과에
예약을 했다. (제일 가까운 곳에 가지 않은 이유는
원장선생님이 남자 분이셨기 때문.
나의 문제를 아무 거리낌 없이 털어놓으려면
이래저래 여자선생님이 나을 것 같단 생각이다.)
기존 예약 대기자가 너무 많고,
이것도 그나마 일주일 전에 예약해 놓은거라서
오늘 내원하지 않으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했다.
그러기에는 요 근래 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기에,
오전에 잡힌 이른 예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세수로 눈꼽만 겨우 떼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집을 나섰다.
날씨가 많이 춥지는 않지만
병원 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의 기분이
약간 이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 병원 내원 "
정신과는 어떤 곳일까?
11시 예약에 맞춰 10분 일찍 갔는데 50분 가량을
기다리고서야 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다리면서 든 생각은,
요즘 참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나보다,
이렇게나 대기 환자가 많다니… 였다.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Mental hospital(정신병원), Mental clinic(정신과)의
차가운 느낌이 너무 익숙해서였을까,
따뜻한 톤으로 깔끔하게 인테리어 되어있는
시설을 둘러보며, 정신과가 아닌
일반 병원에 온 것만 같은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어딘가 삭막한 분위기 속에,
대기실에서 느껴지는 무언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각기 다른 증상으로 이 병원을 찾았겠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힘들겠지.
" 상담 시작 "
'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야한다. '
' 상담사와의 케미가 좋아야한다. '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주워들은터라
제발.. 제발.. 걱정하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첫인상이 단정하고 차분한 느낌의 여자 선생님이셨다.
처음 뵙는거라 굉장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질문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덤덤하고 아무렇지 않게 내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
당분간은 괜찮은 병원을 다시 알아보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우선은 다행이었고,
첫 상담을 맡아주신 분이 마음에 들어서 안심이 됐다.
사실,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앉아
내 속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는 것,
그리고 약을 처방 받아 꾸준히 투약할 의지를 갖고
이 시설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는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와 이런 수다를 떨기엔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다.
하지만 이 관문을 넘어서야 무엇 하나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30분 가량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털어놓았고,
선생님은 일주일치 항우울제를 처방해주시겠다고 했다.
첫 상담이라 진료비는 23,800원이 나왔다.
집에 도착해서 입맛은 딱히 없었지만,
처방받은 약이 공복에 좋지 않다고 해서
억지로 김밥을 사먹고 오후 12시 40분이 다 되어
내 생의 첫 항우울제를 먹었다.
약을 복용한 후 느낀 것들은
더 자세하게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기로 한다.
-
'환자일기 > 정신과에 가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5mg 복용 후기 - 6일차 (0) | 2020.04.06 |
|---|---|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5mg 복용 후기 - 4,5 일차 (0) | 2020.04.04 |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5mg 복용 후기 - 3일차 (0) | 2020.04.02 |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복용 후기 - 2일차 (0) | 2020.03.28 |
| 항우울제 브린텔릭스 복용 후기 - 1일차 (0) | 2020.03.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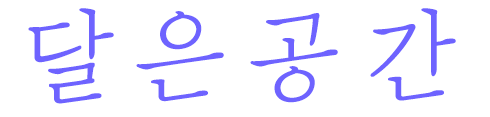








댓글